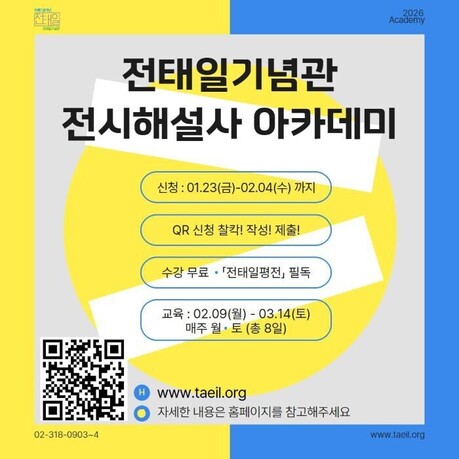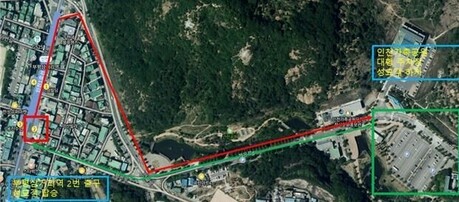메마른 땅에 뿌리를 내리려는 이들에게

이슈앤/ 지난 칼럼에서 필자는, 누구에게나 고유한 삶의 리듬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치열한 하루를 살아내는 이들에게 그 말은 때때로 현실과 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멈추면 바로 뒤처질 것 같은 불안 속에서 지낸다.
일이 조금만 어긋나도 습관처럼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고,
지쳐 있을수록 오히려 자신을 더 몰아붙이며 버티려 한다.
마치 더 아플수록 성장하는 것처럼 믿으며.
명리학에서는 이런 모습을, 갑목(甲木)과 무토(戊土)가 어긋나게 만났을 때의 풍경으로 설명하곤 한다.
성장하고 싶은 나무가 넓은 땅을 만났지만, 그 땅이 너무 메말라 있다면 뿌리는 자연스럽게 내려가지 못한다.
결국 나무는 스스로를 상해가며 억지로 땅을 뚫으려 한다.
이때 생겨나는 거친 기운을 ‘살성(殺性)’이라고 부른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이 고된 마찰을 ‘열정’으로 착각한다는 데 있다.
필자가 만났던 40대 직장인 K씨도 그러했다.
그는 언제나 책임감이 강했고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몸과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아무리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고, 쉬는 날에도 업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막연한 불안이 자꾸만 치밀어 올라, 잠시 멍해지면 스스로 무너질 것 같다고 했다.
그가 쏟아붓던 성실함은 더 이상 그를 앞으로 밀어주는 힘이 아니었다.
이미 메말라버린 상태에서 자신을 계속 밀어붙이는 일은 성장이라기보다 소모에 가까웠다.
그가 느끼던 예민함과 번아웃은, 안쪽에서 살성이 자신을 향해 돌아서고 있다는 신호였다.
관계에서도 이런 장면은 낯설지 않다.
중학생 자녀를 둔 L씨는 누구보다 헌신적인 부모였다.
아이의 생활을 세심하게 챙겼고,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바로 다잡아주려 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가 필요로 했던 것은 완벽한 관리가 아니라,
불안을 잠시 누그러뜨릴 수 있는 ‘물기’ 같은 온기였다.
결국 아이는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잠갔다.
메마른 땅에 억지로 뿌리를 심으려다, 오히려 뿌리가 상해버린 것이다.
사람은 일이 막히면 더 강한 의지로 밀어붙이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때로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서 있는 땅이 지나치게 말라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잠깐 숨 고르는 시간, 소소한 취미, 아무 목적 없는 휴식 같은 것들이다.
그 작은 여유가 쌓여야, 안쪽의 마찰열이 식고 다시 건강하게 자랄 힘이 생긴다.
필자는 조심스럽게 권하고 싶다.
지금 쥐고 있는 그 치열함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무기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 자신을 향해 되돌아온 흉기인지, 한 번 천천히 살펴보기를.
메마른 땅을 피를 흘리며 뚫고 나가는 것이 늘 최선은 아니다.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 그 순간, 아주 작은 물기 하나만 스며들어도 뿌리는 다시 살아날 힘을 조용히 되찾기도 한다.
[이슈앤 = 현담 칼럼니스트]
[저작권자ⓒ 이슈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